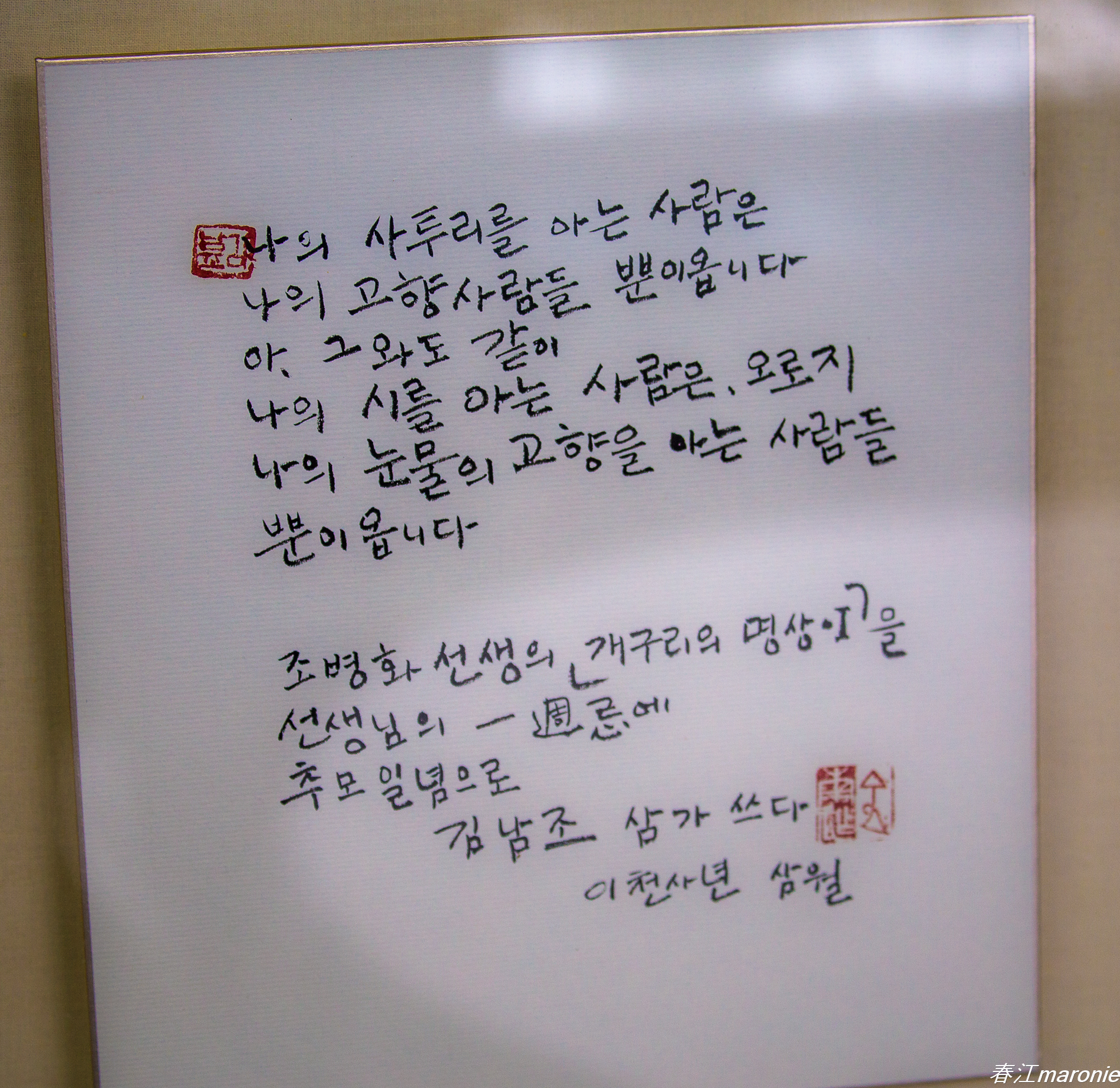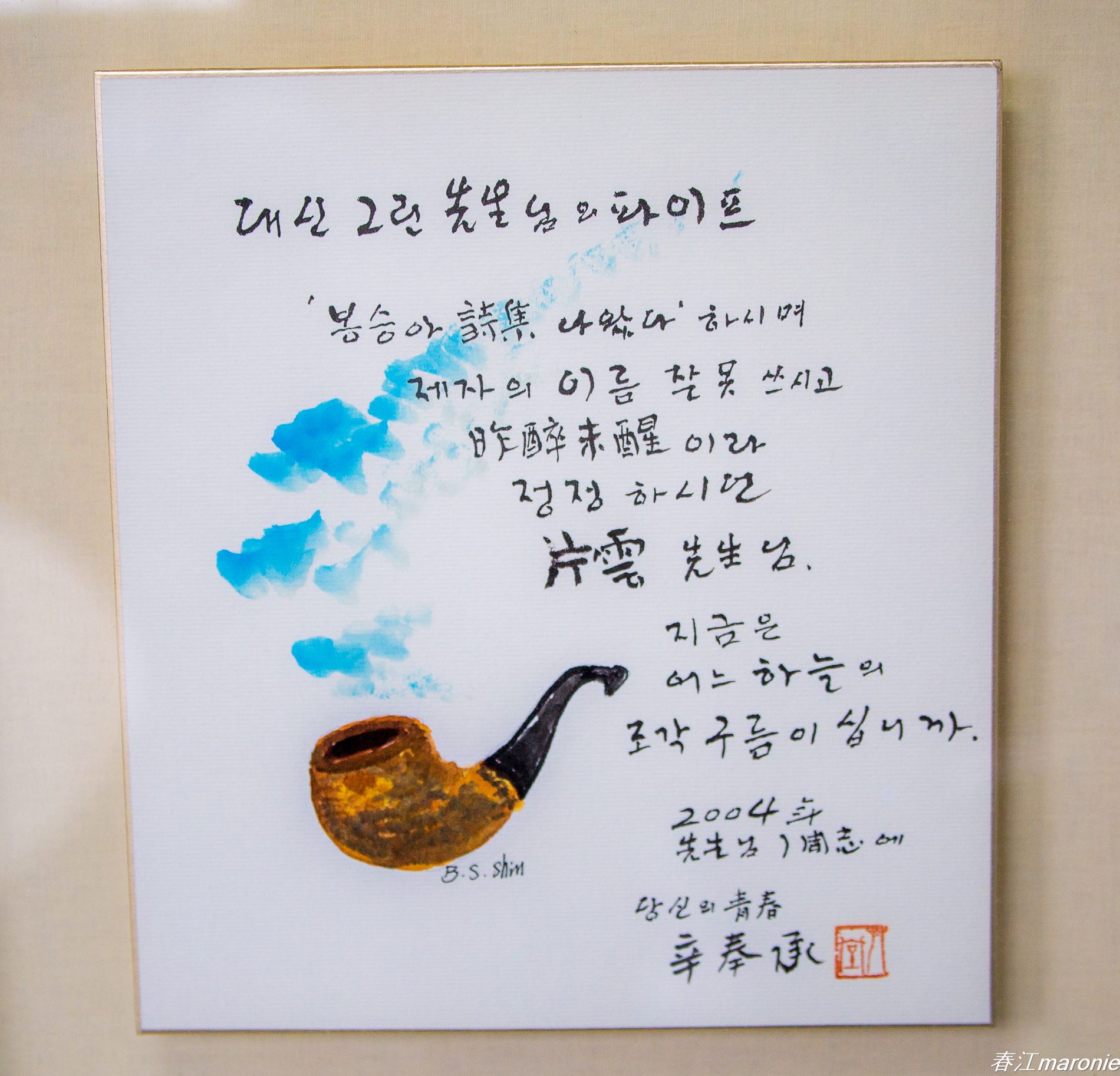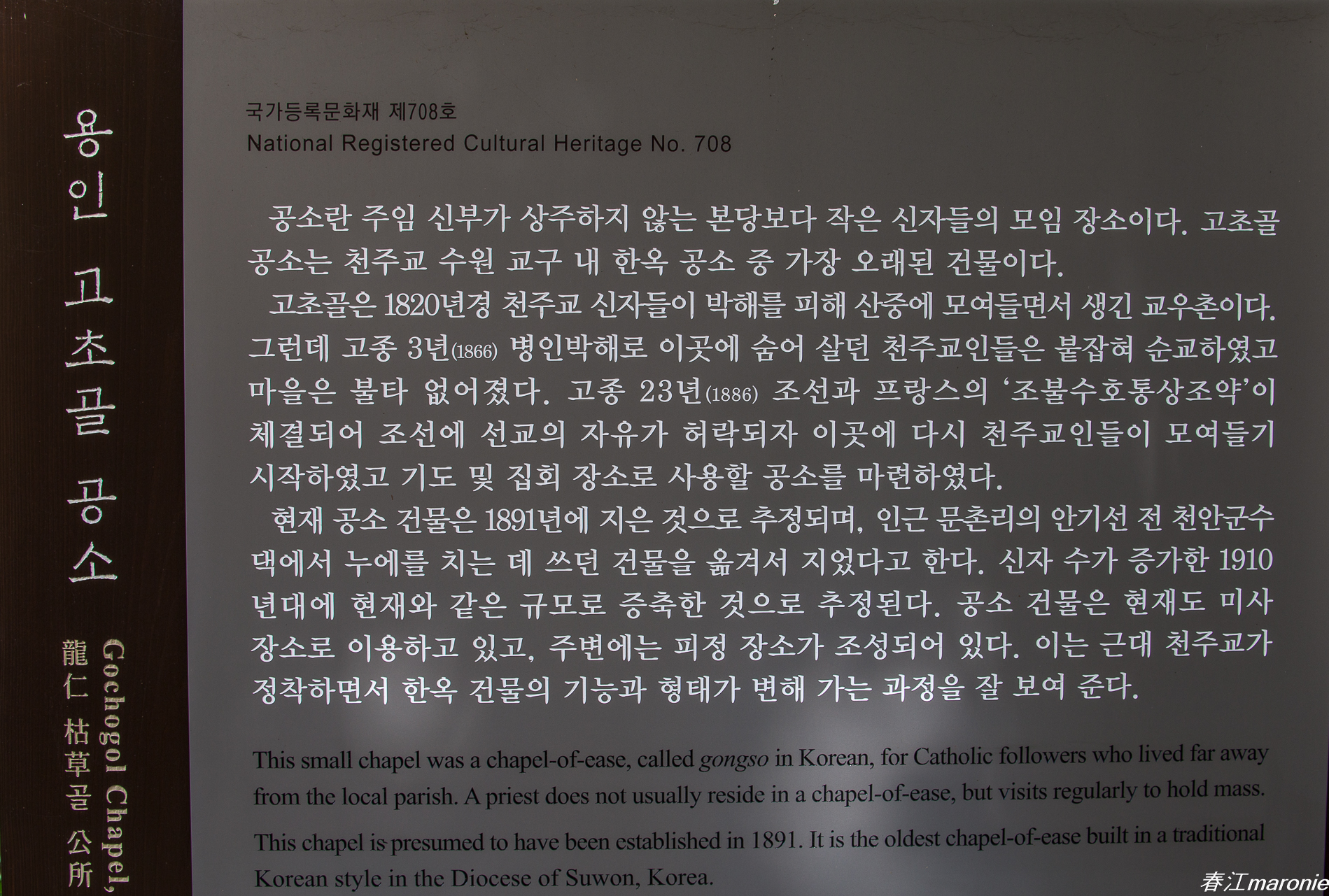안성 남쪽 즈음에는 금광 저수지가 있다. 예전에도 가끔씩 찾았었고
근래 청주 공항을 다녀오던 중에도 들러서 민물 매운탕을 먹었던 곳이다.
토요일 오후 가을 들판 사진도 찍을 겸 아내와 둘이 금광저수지에 있는
석이네 매운탕 집을 목표로 달렸다. 매운탕 집을 지나 안쪽으로 천룡cc
가는 길로 급히 갔지만 해가 서산에 가려 이미 빛을 잃고 있었다. 아!
이러면 사진은 안 되는데!!~
저수지 최 상류에 보니 박두진 시인 산책길 이란게 있었다. 초 가을 저녁
선선한 공기와 호수의 물위로 피래미가 뛰어 오르는 모습은 평화로웠다.
호수옆으로 나무로 만든 길을 따라 유유자적 걸었다. 그런데 입구의 팻말에
안성 8경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다. 으례 어디든 가면 무슨 8경이니 충주
8경이니, 제천 8경 등등 흔한 그런것 이었지만, 주로 안성 부근에 있는 풍광
이 많고 내 고향 일죽은 하나도 포함된게 없었다.
안성 팔경은, 비봉산 일출, 고삼저수지, 미리내 성지, 칠장사, 석남사, 죽주산성
금광저수지,서운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일죽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 뭐 말이야 8경이지만 그리 준수한 풍광이라고 하기는 어려
울듯도 한 것이 지방의 8경이라는것이다. 이에 비하면 여주의 8경은 사뭇 서정
적이다.
( 여주팔경 )
1.神勒暮鍾 (신륵모종) 신륵사에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2.馬巖漁燈 (마암어등) 마암앞 강가에 고기잡이배의 등불 밝히는 풍경
3.鶴洞暮煙 (학동모연) 강건너 학동에 저녁밥 짓는 연기
4.燕灘歸帆 (연탄귀범) 강 여울에 돛단배 귀가하는 모습
5.洋島落雁 (양도낙안) 양섬에 기러기떼 내리는 모습
6.八藪長林 (팔수장림) 오학리 강변의 무성한 숲이 강에 비치는 전경
7.二陵杜鵑 (이릉두견) 영릉과 녕릉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
8.婆娑過雨 (파사과우) 파사성에 여름철 소나기 스치는 광경
이만하면 한폭의 그림이 연상되지 않는가? 기암절벽, 포복절도의
까무라치는 절경이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우리의 시골 풍광이 자연
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해서 이튿날 고향을 가 보기로했다. 멀지 않은 곳이라 자주 들르기는 하지만
뭐 그리 특별할것 없는 고향인데, 가을철 누런 황금 들판을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었다. 8경이라는 고삼 저수지를 넘어 천주교 공원 묘지를 지나 덕산
저수지를 옆으로해서 죽산을 거쳐 가는 길을 택했다. 고삼 저수지 가기전 신안cc
뒷산의 구름이 아름다웠다.
 신안cc 뒷산의 구름
신안cc 뒷산의 구름
저수지는 가을 햇살에 빛나고 하얀 구름은 두둥실 물위에 떠있다
 고삼 저수지의 오후
고삼 저수지의 오후
안성 골프존 H 를 지나 고개를 넘는다. 사실 저 아래 입구부터 고개를 넘어
호수까지는 깊은 산골이지만 뭔가 모르게 이 부근은 청정도가 떨어지는 곳이다.
흐르는 냇물은 혼탁하고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아마도 축사일 가능성이 많다.그러나
산 기슭의 풍광은 어디 못지않게 좋은곳이다.
 덕산 저수지의 구름
덕산 저수지의 구름
죽산 구 도로로 계속 차를 몰고 간다. 오랜만에 죽산도 구경할겸
시내로 들어간다. 동네에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코로나
때문일게다. 그러나 정말 너무 아무도 안 다닌다. 마치 민방위 훈련할
때 정도이다. 아! 큰일이군^
일죽 동물 입구 3거리에 간신히 주차를 시킨다. 여기서부터 들판으로 걸어야 한다.
내가 어릴적엔 여기가 모두 넓은 들판이었다. 적어도 안성군에서는 제일 넓은
들판이었는데, 지금은 비닐 하우스와 각종 시설물과 인삼밭과 심지어는 사과
과수원까지 있어서 누런 황금 벌판은 온데간데 없이 되고 말았다. 평야로 유지
되었다면 족히 2백만평은 넘을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무지 공장 지대인지 평야 인지 구분이 안간다. 농토가 이렇게 철저히
파헤쳐 지다니~ 아마도 쌀의 소비가 급감한 이유도 있을것이다. 쌀 농사
로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단 얘기 아닐까?
 능국리 앞 들판에서서 노송산을 바라보다
능국리 앞 들판에서서 노송산을 바라보다
노송산은 또 어떤가? 산이 통째로 외지인에게 팔리긴 했지만 저곳에
저런 구조물을 세울거란 생각은 못했을거다. 저런 건물을 왜? 산에 굳이
세운단 말인가? 미관상도 않 좋고 풍수 지리적으로도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다. 나야 뭐 여길 떠났으니 그렇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에겐 별로 좋아
보이질 않는다 . 거기다 논 중간에 육중한 저 구조물! 도무지 공장지대인지
평야인지 구분이 안 간다! 논이 이렇게 된데는 다 이유가 있을것이다. 백날
농사 지어 봤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푸념하는 얘길 들은지 오래다. 거기다
쌀 소비가 대폭 줄어든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러니 수익이 더 나는 대체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것 등으로 논이 바뀐지 오래 되었다.
 청미천과 지류가 만나던 곳
청미천과 지류가 만나던 곳
비교적 맑은 물이 흐르는 이곳^ 옛날 개울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 오른다
당연 옛날에는 개울에 풀이 없었고 하얀 모래가 압도적으로 많았었다
 옛날 우리 밭이 있던 곳
옛날 우리 밭이 있던 곳
누런 흙이 있는 부근과 좌측으로 3000평 우리 밭이 있던 곳이다. 그 옛날엔
좌우 앞에 보이는 저런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다. 고운 모래가루로 되었었던
저 밭^ 드러 누워 멀리 종달새 지저귀는 걸 듣다 일어나도 모래 하나 묻지 않았었다
 멀리 남쪽으로 마이산이 보인다
멀리 남쪽으로 마이산이 보인다
이 개울을 건너 학교를 가기도 했다. 물이 깊지 않고 물살 또한 매우
완만했었으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우리 밭에 들러 콩이며 고구마며
땅콩 등을 캐어 먹기도 했었다.
 주원 오리농장이 들어선 밭
주원 오리농장이 들어선 밭
어떻게 여기 오리 농장이 들어 섰을까? 왜냐면 여기는 여름 홍수에 반드시
물이 차서 농작물을 망치던 곳이었으니까! 지금은 물이 안 찬다는 말인가?
둑을 높이 쌓아도 그게 어려울텐데!
 예전에 없던 미류나무
예전에 없던 미류나무
저 미류나무는 아마도 수십년은 자란듯 싶다. 내가 어릴땐 없던 나무다
고향에 미류나무가 푸르르면 돌아 온다던 유행가가 생각난다. 나무가 저리
크게 자랐지만 나는 고향엘 돌아갈수가 없구나! 그동안 더러 고향을 와도 여기
우리밭이 있던곳까지 와 볼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 . 1980년대 초기에 한번 와 본 후
처음이다. 그땐 원형이 보존되어 땅콩도 심어져 있었고 했는데!
상전이 벽해처럼 변해버린 옛날 우리밭 언덕에서 나는 애써 기억을 떠올리려
애를 쓰면서 한편으론 무심히 지난 세월을 야속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중요한건 내가 지금 여기 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내 고향이 변한들,
아무리 옛 맛이 안 난들! 그것이 뭐 중요하랴! 나는 그동안 이 고향이 변해
가는데 무엇 하나 일조한게 없지 않느냐? 변한건 변한거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자! 땅 자체가 사라진건 아니니 말이다^
 국골을 아랫 기홍이네 산 밑에서 본 풍광
국골을 아랫 기홍이네 산 밑에서 본 풍광
국골은 아주 한적한 동네였었다. 노송산 아래 포근히 자리잡은 동네였다.
흐르던 물 조차 신비하던 이곳이었다.
 멀리 구름밭 쪽을 본다
멀리 구름밭 쪽을 본다
거의 청정 지역이던 이곳 노송산으로 밤에 참 나무를 베러 가기도 했고
메뚜기를 잡으러, 멀리 장이울 고개로 밤을 따러 가기도 하던 곳이다
 당촌리를 간다
당촌리를 간다
일죽면의 가장 동쪽 당촌리, 바로 너머는 이천군이다. 옛날엔 그저 자그마한
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일죽면에서 가장 큰 벌판이 되었다. 논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강대 대학원장을 역임한 박성호 형의 논이었다는데
여러 형제들 공부한다고 학비로 인해 다 팔아 치웠단다!
 청미천이 넓어지는 곳이다
청미천이 넓어지는 곳이다
여긴 피래미 등 고기가 많은지 동네에 어죽탕을 만들어 파는 집성촌이
되었다. 아직 한번도 먹어 본적은 없지만, 아주 옛날 초등학교 시절 여기
친구와 함께 콩새 집을 들여다 보던 곳이다. 당시 콩새는 높은 미류나무 위에
집을 지었었다
 저 왼쪽 위 왼쪽이 나의 고향 집이 있던 곳이다
저 왼쪽 위 왼쪽이 나의 고향 집이 있던 곳이다
눈만 뜨면 바라 보던 집앞 논들^ 이제 이 사진으로 자주 들여다 보고 싶다. 집에서
보든 풍광이 아니고 거꾸로 아래에서 올려다 본 것이다
 우측 맞은편 산으로 수도 없이 자주 오가던 길이다
우측 맞은편 산으로 수도 없이 자주 오가던 길이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고향 땅은 그대로이다. 내가 살던 집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느즈막이 여기 와서 살 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리운 곳이다. 눈 감으면
으례 떠오르는 곳!
 노송산이 훼손되지 않게 보이는 모습이다
노송산이 훼손되지 않게 보이는 모습이다
비록 작은 산이지만 나에게는 성산과 같은 곳이기에 이렇게 찍어 보존하고
싶은 곳이다. 사실 일죽을 고향으로 둔 많은 친구들도 그렇지 않을까?

산북리 쪽으로 가면서 멀리 능국리 노송산을 바라본 풍경이다. 노송산은
일죽면 쪽에서 봐야 모양이 살아난다. 이천쪽으로 가면 전혀 산 다운 풍모가
살아나지를 않는다.
산북리를 지나 이천 율면 쪽으로 더 가봤지만 아무것도 더 볼게 없었다
얼른 차를 돌려 다시 산북리로 돌아 나온다. 이제 동물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죽화 국민학교 쪽을 지나 방초리로 넘어가야한다. 그런데 가는 길에 신흥리 앞 쯤
에서 멋진 코스모스를 만났다. 코스모스라고 아무것이나 이쁜 건 아니다. 괜찮은
코스모스 만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부근은 6월쯤 인가에는 물 양귀비가 아름답게 피던 곳이다. 아무래도
근처에 사는 분이 꽃을 매우 잘 가꾸거나 관심이 많은 분이지 싶다. 아름다운 꽃을
멋지게 키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본다
해는 이제 서산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다. 나름 부리나케 달려 백암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주로 백암근처를 가을 들판 주 촬영지로 했었다. 그것은 일죽의 평야가
그 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넓은 평야가 유지되었다면 나는 백암이
아니고 일죽을 주 무대로 했을것이다.
비록 소리없이 가고 오고 하지만 역시 내 마음의 고향은 일죽일 수 밖에 없으니
앞으론 더 자주 일죽의 풍광 촬영에 임할 생각이다